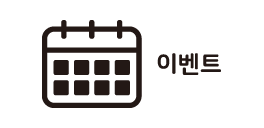특별 기고
제 8회 KOICA 글짓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
우리라는 이름으로
글. 구정고등학교 2학년 10반 황희수
우리. 가만히 중얼거려 봅니다.
우리,먼저 입술이 모여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살짝 옆으로 벌어지며 성대의 떨림을 입 밖으로 내보냅니다. 우리. 우리. 묘한 소리가 가슴에 맴돕니다. 영어의 ‘We’와 뜻은 같지만 다른 울림을 만들어 내는 말, 오히려 ‘I’처럼 일상에서 사용되는 단어, 우리.
눈을 감고 단어가 만들어 내는 여운을 떠올려 봅니다. 늘 사용되는 단어가 문득 낯설고도 아주 따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뜻을 차근히 생각해 보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지칭하는 걸까? 나와 내 주변의 친한 사람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나’의 범위에서 약간만 확장 시켜 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사랑의 빵을 하나씩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진을 저는 외계인처럼 제 또래의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제게는 너무나도 먼 세계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우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틈틈이 동전을 넣어 몇 번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사랑의 빵을 거의 저금통 대신으로 썼습니다. 어린 마음에 고민 고민하며 500원짜리를 슬쩍 꺼내기도 했고 대부분 그 작은 플라스틱 통을 10월, 100원짜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를 구겨 넣을 때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 원이면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죽 몇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운 외국 어린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슴 아파했지만 그 때뿐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뿐이었고, 책장을 덮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저와 연결되는 아무런 끈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굶주리고, 떠도는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의 이미지로 그저 소비해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동정할 뿐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플랜코리아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수기를 통해서 였습니다. 6.25 이후 양친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 분은 지금 베트남에 있는 소녀에게 사랑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양친회의 도움을 받았던 제가 이제는 플랜코리아를 통해 부모로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6.25 직후 한국에 설립된 양친회가 지금은 플랜코리아가 되어 오히려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서로 서로 돕고 있는 손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약한 것은 누군가 넘어졌을 때 하나가 하나를 일으켜 나아가게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가만히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희수야, 내가 너를 딸로 사랑했듯이 너도 다른 이들이 사랑하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란다.
제가 저 멀리 인도 남부 인도양 해상에 있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거리가 온통 붉은 악마들로 물들 때 저는 한 통의 편지와 작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두 말리 한사니 세네레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였지만… 사진을 받았을 때 까무잡잡한 피부와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크고 검은 눈이 먼저 와 닿았습니다. 인두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깜짝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낡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인두. 다시 사진을 들여다 보았을 때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서툰 영어로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인두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에 설?습니다. 색연필과 인형을 포장해 선물로 보냈었습니다. 그러고는 잊고 있었는데 1년쯤 지나 편지가 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인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글자가 어지러웠습니다. 선물로 보낸 색연필로 그렸다는 그림도 함께 왔습니다. 어두운 인두의 표정과는 달리 그림은 무척이나 밝았고 화사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 매년 한번씩 사진이 왔고 아주 희미했지만 인두의 표정은 점차 밝아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준 것은 용돈을 조금 쪼갠 후원금 이었지만 제가 받은 것은 사랑과 기쁨이었습니다. 돕는다는 기쁨, 동정이 아닌 사랑의 기쁨!
얼마 전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나의 주장발표 대회에 따라갔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꽃제비 이야기를 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또,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고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무 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연설에서 북한 어린이들은 어디까지나 도와야 할 ‘그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비단 북한 인원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 순간 고통 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면 그 많은 이들을 ‘그들’로 경계를 짓고 철저하게 구분 짓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와 ‘너희들’, ‘그들’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될 ?, 우리가 다른 이들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안아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국경과 인종을 넘어 다른 이들을 보듬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두를 통해 저는 제 마음에 작은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방이었습니다. 인두를 알게 되면서 스리랑카는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갑고, 가깝고, 당연히 도와야 할 곳이었습니다. 인두가 살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제 동생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기쁨과 사랑의 떨림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랑은 배가 되어 돌아오기에.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후원 대상국이었습니다. ‘양친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외국의 후원자들에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긴급구호를 포함해서 20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지원 받은 것입니다. 지원은 1979년 중단됐고, 1996년 5월에는 OECD가입을 계기로 수혜국중 최초로 후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되돌리는데 어색한 듯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불우 이웃을 먼저 도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국내외 아무도 돕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어린이를 돕는 분들 중에는 한국 어린이를 먼저 돕고 외국으로 눈을 돌린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아무런 경계도,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실천이라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사실은 정말로 단순하고 간단해서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제협력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아닌, 작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블리스 오블리제’나 ‘기부문화’보다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우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따스한 情 문화를 이제는 세계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인두에게 편지를 다시 보내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시험이나 학원 등을 핑계로 미루어뒀던 편지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학년이 된 인두는 스티커 수집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학교 갔다 오면서 스티커를 사야겠습니다. 내게는 작은 것들이 다른 이에게 큰 기쁨으로 변합니다.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그 기쁨은 더 크게 따스함과 함께 제게 전해집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말이 가진 울림과도 비슷합니다. 우
우리. 또 하나의 우리. 이제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좀더 멀리 그 범위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